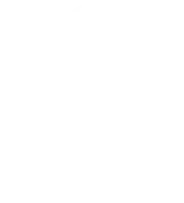- 다양한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글을 작성하는 게시판입니다.
| Date | 17/04/02 11:35:37 |
| Name | 따개비 |
| Subject | 마지막의 마지막 |
|
가을과 겨울 사이 쌀쌀해지기 시작할 무렵의 어느 날. 야행성인 나는 딱히 하는 일 없이 새벽까지 어김없이 말똥말똥 깨어있었다. 갑자기 징지잉 지잉 휴대폰의 진동소리가 울려댔다. 저장되어있지 않은 번호임에도 낯이 익은데... 설마. "여보세요" "..아람아" 윤이었다. 두 살이나 어린 주제에 누나라고는 단 한 번도 부르지 않았던, 나를 늘 이름으로 불러줬던 네 목소리를. 단번에 알아챘음에도 모르는 척 한 번 더 뱉었다. "여보세요..?" "아람아, 나. 난데. 혹시 지금 우리 집에 와 줄 수.. 있어?" "왜...?" "아니... 그냥 너가 너무 보고 싶어서... 전화해봤어." "너 술 마셨니?" "아니. 그냥 네가 여기.. 지금 있었으면 좋겠어. 와 줬으면 좋겠어. 부탁해.." "... 나 못 가. 알잖아. ...일단 끊을게. 자고 나서도 할 말 있으면 내일 연락해줘." 전화를 끊고 나니 심장이 파도마냥 일렁였다. 더듬더듬 기억 속 너와의 마지막을 떠올려본다. 아니 정확히는 네 휴대폰 너머 그 여자애와의 전화통화를. -언니 저 윤이랑 만나고 있거든요. 언니 거기 가고서 계속 연락하고 만나고 있었어요. 그거 말해주려고 전화했어요. 이젠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가뜩이나 시차도 아랑곳하지 않고 걸어와 잠결에 받았는데, 숨도 안 쉬고 도도도도 쏘아붙이던 말투에 말문이 막혀 한마디 대꾸도 못한 채 전화는 끊어졌다. 꿈인가 싶었지만 그 후로 두 번 다시 네 번호는 내 휴대폰을 울리지 않았다. 그래, 그랬네. 벌써 일 년도 더 지난 일이었다. 나는 그렇게 너를 잃었고 잊었다-고 생각했다. 뜬눈으로 밤을 새고 멍한 눈으로 전철에 올랐다. 수없이 만나고 바래다주던 그 역에 내려 꼬불꼬불 골목길을 걷다 보니 자연스레 눈앞에 너의 집이 나타났다. 길눈도 더럽게 어두운 주제에 이 길은 왜 잊지도 못한 걸까. 현관문 앞에 서서 401호라고 적힌 숫자판과 손잡이를 번갈아 노려보며 생각한다. 이제 어떻게 하지. 벨을 누르고... 뭐라고 말할까. 나야, 했는데 다른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건 아닐까. 아니 근데, 다른 사람이 나오면 어쩌지? 그냥 갈까?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도 왜 오라고 한 건지 확인은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전화해볼까? 아직 연락이 없는 거 보니 취해서 자는 거 아닌가. 아니.. 나는. 애초에 여기에 왜 온 거지. 왜? 모르겠어. 왜 온 거야?? 몰라 나도. 모른다고!! 홧김에 냅다 손잡이를 잡고 낚아채듯 돌려버렸다. 문은 잠겨있지 않았다. 열린 문틈 사이로 네 냄새가 연기처럼 새어 나와, 문 앞에서부터 이미 터질 것 같았던 심장에 그리움이 더해져 믿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쿵쾅쿵쾅쿵쿵 뛰기 시작했다. 어깨를 잔뜩 움츠린 채 방 안에 들어서자 어둠 속 나지막이 퍼지는 네 숨소리만으로도 단번에 알 수 있었다. 네가 아프다는 걸. 내가 들어온 기척도 못 느낀 채 홍조 띈 얼굴로 쌕쌕 숨소리만 내뱉는 네 모양새에 마음속 무언가가 녹아내리는 기분이 들었다. 나도 모르게 숨죽이고 다가가 너의 땀투성이 이마에, 그리고 목덜미에 슬쩍 손등을 대 보고는 멋쩍은 기분이 들어 괜스레 이불만 도닥이고 슬그머니 밖으로 나왔다. 뭔가에 홀리듯이 근처 마트에 들러 식재료 몇 가지를 사고 이번엔 좀 더 조심스럽게 손잡이를 잡아 조용히 문을 열었다. 너는 아마 잠에서 깨어났어도 잠든 척을 했으리라. 복작복작 부엌에서 무언가를 만드는 소리에도 일어나지 않던 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가스 불을 끄고 슬쩍 돌아보니 너는 언제 깨어났는지 침대 머리맡에 반쯤 기대어 앉아있었다. 그 모습에 머릿속에선 자꾸만 말을 꺼내어 목구멍까지 밀어냈지만 나오지 않았다.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눈 둘 곳조차 찾지 못한 내가 무심결에 고개를 숙여버리자, 귓가에 네 목소리가 띄엄띄엄 박혀왔다. "미안해.. 보고싶었어. 그냥.. 널 보면.. 다 괜찮아질 거 같았어." 괜찮은 게 뭔데. 왜 하필 내가 널 어떻게 괜찮게 해줘야 하는 건데. 이제 와서 뭐가 미안한 건데. 그때 넌 왜 그랬던 건데. 지금 그런 말들이 무슨 소용인 건데. 나도 그 여자애처럼 네게 쏘아붙이고 싶었다. 한껏 쏘아붙이며 뺨이라도 때렸다면 울지 않을 수 있었을까. "죽... 조금이라도 먹고 약 먹어. 심해지면 병원 꼭 가." 애써 주먹을 꽉 쥐었는데도 목소리가 떨렸다. 이내 눈물이 투두둑 떨어지고 흐어엉. 울음이 터져 나왔다. 동시에 난데없이 네 웃음소리가 방 안에 울렸다. 잘못 들었나.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들어보니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바들바들 떨고 있는 네 모습이 보였다. 설마. 콧물과 물음표가 잔뜩 묻은 표정으로 훌쩍이며 주춤주춤 다가갔다. "아람아" 그의 표정을 감추고 있던 두 손은 어느샌가 내 볼을 감싸쥐었고, 따뜻함을 넘어 뜨거움이 느껴지려는 찰나 그의 입술이 내 입술을 덮쳐왔다. 길고 긴 입맞춤 끝에 흐느낌은 점차 신음으로 바뀌었다. 윤과는 그렇게, 그 날이 마지막이었다. 아마도 윤이었을 번호로 휴대폰은 몇 번 더 울렸고, 때로는 장문의 문자가 수신되는 나날도 있었지만 말이다. 4
이 게시판에 등록된 따개비님의 최근 게시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