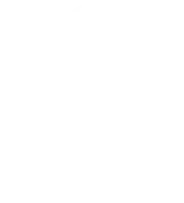- 다양한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글을 작성하는 게시판입니다.
| Date | 25/08/28 22:58:07 |
| Name | SCV |
| Subject | 따뜻한 것이 있다면 |
|
퇴근길이 늦어졌다. 아니, 일부러 늦췄다고 해야 맞다. 회의가 길어졌던 것도 아니고, 회식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그냥, 사무실 불을 가장 나중까지 켜놓고 있다가, 마지막 엘리베이터를 기다려 집에 가는 사람이 된 거였다. 늦은 밤, 마지막 버스를 타지 않고 도보로 20분 남짓 되는 집까지 걸어가는 중이었다. 집에 가서 해야 할 일은 없었고, 하지 말아야 할 일도 없었다. 그래도 집에 가까워질수록 괜히 마음이 무거워지는 건 이상한 일이다. 오늘 하루도, 별일은 없었다. 그게 더 슬펐다. 횡단보도 앞 신호가 아직 파란색으로 점멸하고 있었다. 느릿하게 뛰듯 건넜다. 뛰는 척만 하고, 제대로 뛰지는 않았다.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적당히 속도 내는 척, 적당히 열심인 척. 건널목을 넘어 작은 공원 앞을 지날 무렵, 낯선 시선 같은 것이 느껴졌다. 발걸음을 멈췄을 때, 가로등 아래 길고 날렵한 그림자 하나가 내 앞에서 멈췄다. 고양이였다. 정확히는 ‘내가 본 것 중 가장 뼈가 얇아보이는 고양이’였다. 검은 무늬가 중간에 끊어져 있는 회색 고양이. 목 뒤쪽 털은 부분적으로 지워진 듯 흐릿했고, 눈은 탁한 호박색이었지만 어딘가 사람 눈을 닮아 있었다. 그 고양이는 내 발 앞쪽을 응시하고 있었고, 나도 이유 없이 그대로 멈춰 서 있었다. “너, 춥지 않냐.” 말을 걸어놓고서 내가 더 민망해졌다. 고양이가 사람의 말을 알아들을 리가 없었다. 혹, 알아듣는다 해도, 대답을 듣고 싶지는 않았다. 대답을 해버리면, 뭔가 잃어버릴 것 같았으니까. 가방 속에 뭐가 있었지 하고 손을 더듬다가, 아침에 편의점에서 샀다가 잊어버리고 미쳐 다 못 먹은 남은 호떡 하나를 꺼냈다. 따뜻하지도 않고, 눅눅했지만. 그것밖에 없었다. 종이 포장을 조금 벗겨 고양이 앞에 조심스레 놓았다. 고양이는 한참을 가만히 있더니, 내가 두 걸음 물러서자 그제야 머리를 숙였다. 그 자세로 씹지도 않고 뜯지도 않고 오래도록 냄새만 맡았다. 그리고는 몸을 틀어 도로 뒤쪽, 어두운 수풀 속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나는 한동안 그 호떡 앞에 서 있었다. 먹지도, 버리지도 못한 음식 앞에서. 이상하게도, 그 고양이가 ‘배가 고프지 않았다’는 사실이 너무 외로워 보였다. 그것 말고는 생각이 나질 않았다. 호떡은 놔두고 돌아섰다. 언젠가, 다시 돌아와 있을 수도 있다는 기대로. 혹은, 그것조차 필요 없다는 체념으로. 어느 쪽인지는 모르겠지만. 사람 사는 일이라는 게 원래 그렇지 않나. 집 앞 편의점 불빛이 보였다. 불도 꺼져 있는 집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따뜻한 걸 하나쯤 손에 쥐고 싶어졌다. 따뜻한 것이 있다면, 지금은 이유 없이라도 뭔가 하나 갖고 싶었다. 9
이 게시판에 등록된 SCV님의 최근 게시물 |
|